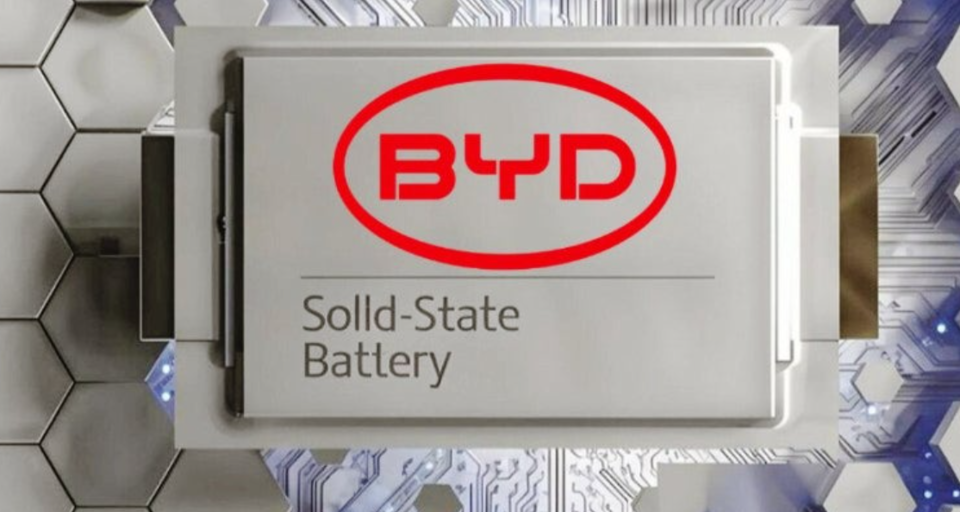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전기차용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시장을 장악한 데 이어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는 ‘반고체’와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도 속도를 내며 기술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는 글로벌 점유율 하락에 이어 기술력 격차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7일 여성경제신문 취재 결과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BYD(비야디)는 최근 자사 인기 모델 실(Seal) EV에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해 테스트를 시작했다.
초기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1875㎞에 달한다. 탑재된 전고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400Wh/㎏으로 12분 만에 80% 충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BYD는 2027년부터 실에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할 예정이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 2년간은 제한된 수량만 생산한 뒤 2030년부터는 대량 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중국 IT 기업이자 최근 전기차 모델을 출시한 화웨이도 얼마전 황화물 기반 전고체 배터리 기술 특허를 출원했다.
화웨이는 이 전고체 배터리가 5분 충전으로 최대 3000km 주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에 대해선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많다.
파라시스 에너지(Farasis Energy)도 지난달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위한 파일럿 생산 단계에 진입했다. 연말까지 0.2GWh 규모의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고 고객사에 60Ah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국 스볼트 에너지(Svolt Energy)는 올해 4분기부터 140Ah 용량의 1세대 반고체 배터리 시험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해당 배터리는 BMW의 차세대 미니(MINI) 모델에 공급될 예정이며 2027년 본격 양산이 계획돼 있다. 에너지 밀도는 1세대 기준 300Wh/kg이며, 향후 2세대는 360Wh/kg, 전고체 배터리는 400Wh/kg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처럼 중국 업체들이 차세대 배터리 양산 일정을 선점하려는 배경에는 전고체와 반고체 배터리가 전기차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고체 배터리는 그동안 일본이 전 세계 관련 특허의 40%가량을 보유할 정도로 기술력이 앞서 있었지만 최근 중국이 빠르게 추격하는 양상을 보인다.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해 화재·폭발 위험을 최소화하고 높은 에너지 밀도로 주행거리 향상이 가능해 차세대 전기차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반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의 중간 단계로 젤(Gel) 전해질을 사용해 화재 위험을 낮추고 안전성과 성능을 균형 있게 확보한 기술이다.
국내 배터리 3사도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고체 배터리는 SK온이 가장 먼저 양산 목표를 제시했다. SK온 측은 “반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에서 2026년 말까지 시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11월 SK엔무브와 합병을 앞둔 SK온은 기존 배터리연구원의 명칭을 ‘미래기술원’으로 변경하고, 전고체·LFP·각형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 개발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 삼성SDI가 가장 빠르다. 2027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진행 중이며 일부 고객사에는 이미 샘플 공급도 시작했다.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말 전고체 파일럿 라인 구축을 완료하고,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배터리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양산 시점을 2026~2027년으로 제시하고 있다”면서도 “실제 시장에서 주력 배터리로 자리매김할지는 가격과 성능 등 다양한 요소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 시점인 2030년이면 현재 국내 배터리 3사가 집중하고 있는 LMR(리튬망간리치), 미드니켈 등 중저가형 차세대 배터리 기술도 상당히 발전해 있을 것”이라며 “반고체 배터리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561